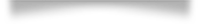진흙탕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고 흙탕물이 묻지 않는다는 특성때문인지, 동양문화권에서는 연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종교가 몇 개 있다.
인도의 종교에서도 연꽃은 중요한 상징이다. 베다 시기부터 연꽃은 신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힌두교의 최고신 중 하나인 브라흐마는 연꽃에 앉아있으며 비슈누의 지물 중에는 연꽃 봉우리 모양을 한 몽둥이가 있다.
불교에서 연꽃은 더더욱 중요시되어서, 당장 절에 가서 불상을 보면 그 대좌가 연꽃 모양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진흙 속에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은 그 때문에 부처의 자비와 지혜를 나타내는 식물로 여겨진 것이다.
도교의 신 중 나타태자는 연꽃에서 태어나 연꽃의 화신이라는 별칭이 있다. 사실 나타도 원산지는 인도에다 불교에 수용되어 도교로 흡수되었다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중국에 들어온 신이라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유교에서도 연꽃은 사랑받았는데, 이유는 더러운 연못에서 깨끗한 꽃을 피우는 모습이 절개를 중시하는 선비들의 기풍과 잘 맞았기 때문. 북송시대 유학자 주돈이는 연꽃의 모습을 군자의 덕에 빗대는 '애련설(愛蓮說)'이라는 글을 남겼다. 다만 유교에서는 사군자가 일반적이여서 연꽃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다.
고대 이집트에서 부활, 영생을 상징했고 흔히 신이나 파라오와 함께 그렸다는 꽃은 일반적인 연꽃이 아니라 수련이다.